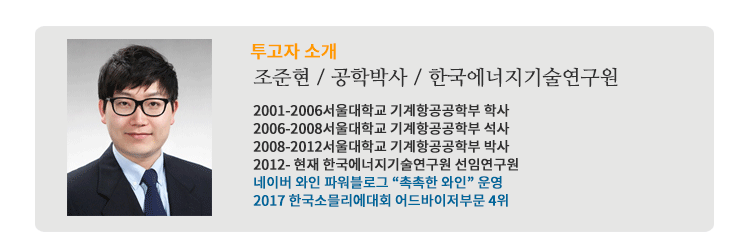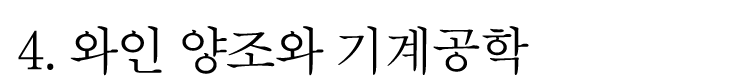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매 해 가을에 수확하며, 수확한 포도를 발효시킨 뒤 오크통에서 일정 기간 숙성 후 병에 담아 출시한다. 와인 양조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넣고 사람이 올라가 포도를 밟는 장면이지 않을까 한다. 로맨스가 있다면 아마도 남녀가 손을 잡고 포도를 밟고 있을 것이다.
포도를 밟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포도알을 으깨어 포도즙(주스)을 껍질과 분리해내는 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큰 통에서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여 포도알이 모두 떠오르게 되어 내부 포도주스들이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표층의 포도를 밟으면서 섞어주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과거부터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전통적인 퍼포먼스 격으로 포도를 밟는 관광상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당연하게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포도를 압착(pressing)하며, 발효과정에서 포도주스를 유체 기계인 펌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계속 순환시켜주는 펌핑오버(pumping over) 등을 사용하여 와인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커피도 에스프레소를 시간을 짧게 내리는 것(리스트레토)과 길게 내리는 것(룽고)이 맛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포도를 중력에 의해서만 자연 압착하여 얻는 첫번째 가장 프루티하고 순수한 프리런(free-run) 주스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힘을 가해 압착하여 얻는 주스로 양조를 시작하는 와인들도 있다. 물론 프리런 주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와인이 더 고품질이며 가격이 높다.
펌핑오버 또한 와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조 방법 인자 중 하나인데, 최근 유행하는 내츄럴와인 중 오렌지와인이 펌핑오버를 더 긴시간동안 진행하여 발효 시 산소와의 접촉과 포도껍질과의 접촉을 더 많이 시켜 산화(oxidation) 풍미를 강조한 오렌지 빛깔 와인이다. (오렌지로 만드는 와인이 아니다.)
위는 기계를 이용하여 와인 제조 공정을 효율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 공학의 발달로 와인 양조 방법 및 와인 스타일이 변화된 이야기를 이번 칼럼에서 해보고자 한다.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기후, 토양, 포도의 재배부터 양조, 숙성 과정에서의 여러 선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복합적이고 정량화가 쉽지 않다.
포도 자체가 우수해야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최상급 재료라도 셰프 실력이 우수해야 감동이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와인 발효 및 숙성 과정에서 와인메이커의 선택과 결정이 와인 품질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와인 품질을 상향 평준화 시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온도 조절 장치의 사용이다. 와이너리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조장에 오크통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스틸 탱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발효’ (fermentation)과정에서 사용하는 탱크들이다. 발효를 마친 뒤 숙성 또한 스테인리스스틸 탱크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초저가 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대부분 발효 후 숙성은 오크통에서 진행한다.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생산자는 발효 또한 오크통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생산자들이 발효 과정에서는 스테인리스스틸 탱크를 사용하며, 여기에 온도조절장치, 즉 칠러(chiller)와 히터(heater), 그리고 콘트롤러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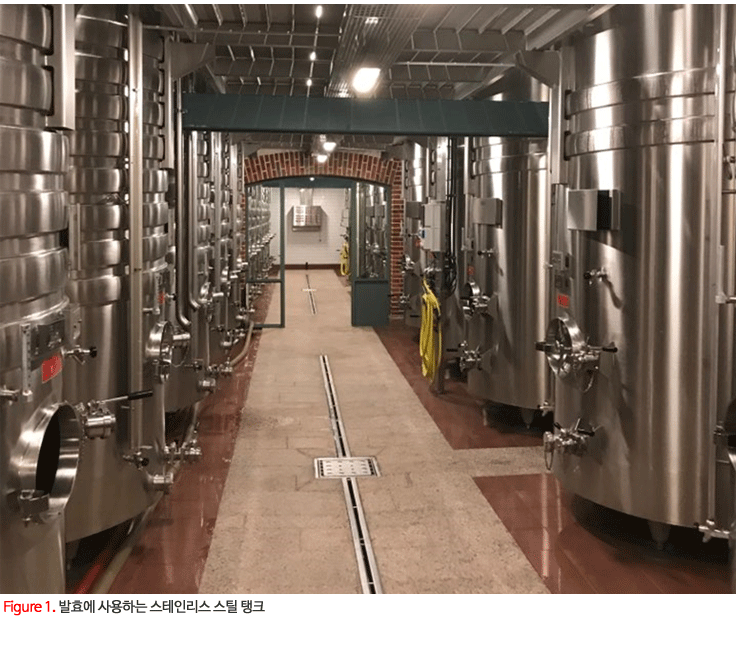
포도당이 효모에 의해 발효되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이 와인의 발효 과정이며, 이 때 발효를 제어할 수 있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발효 온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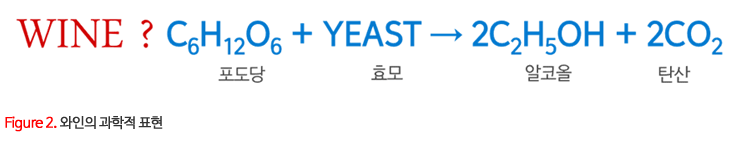
콩으로 메주를 만든 뒤 안방 아랫목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을 생각해보자. 효모가 활동하기에 좋은 온도에서 발효, 즉 다양한 화학반응들이 발생한다.
와인 발효는 주로 15-18℃ 에서 이루어지며, 포도의 품종, 와인 메이커의 의도에 따라 5-8℃ 정도까지 저온 발효하는 경우도 있다. 저온에서 발효할 경우 포도 껍질의 색깔이 더 많이 추출되어 진한 빛깔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 와인 트렌드에서는 진한 색상의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저온 발효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우리가 기계공학 실험이나 화학 실험을 진행할 때, 반응 온도, 반응 시간 등을 조절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온도 상승, 유지, 하강 과정에서 상/하강 rate (ramp rate), 유지 시간 등의 레시피를 지켜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와인 양조에서도 발효 온도 컨트롤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와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서 와인의 발효온도 15-18℃ 는 와인 산지의 가을철 기온과 유사하다. 포도를 수확하여 통에 넣어 발효하던 자연의 온도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자연의 온도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로 바꿈으로써, 와인의 특징을 조금 더 정량화하고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와인 양조시 포도당분의 농도, pH, 알코올함량, 온도 등을 측정하여 최적의 와인 발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연료의 연소이며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부터 사용한 열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냉동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개발된 비교적 신식(?) 기술이다.

영하보다 낮은 온도를 얻기 위한, 즉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1800년대에 들어서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의 특허와 시제품등을 거쳐 상용화된 냉동기가 1800년대 중반 개발되는데, 이 중 가장 파급효과가 컸던 발명품이 바로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이다.
독일 뮌헨의 Technological University of Munich의 공대 교수였던 칼 폰 린데(Carl von Linde)는 암모니아(NH3), 이산화황(SCO2), 메틸클로라이드(CH3CL) 을 냉매로 사용한 냉동기를 개발하였는데, 재미있게도 이 기술 개발을 요구하며, 적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맥주 양조자들이었다.
1800년대 중반 이전의 맥주는 영국의 에일 맥주였으며, 에일 맥주의 특징은 발효과정이 상온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상온 발효를 마친 맥주 효모들이 위로 떠오른다고 하여 상면(上面) 발효라고 부른다.
독일 뮌헨에서 개발된 암모니아 냉동기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뮌헨의 물과 재료들로 맥주를 만들었더니, 에일 보다 더 깔끔하고 시원한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라거 맥주이며, 뮌헨은 라거 맥주의 탄생지가 되었으며, 매년 10월 열리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바로 뮌헨에서 열린다.
저온 발효에 사용하는 효모는 발효를 마치고 죽어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이에 하면(下面) 발효라고 부른다.
린데가 발명한 암모니아 냉동기로인해 맥주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였는데, 이 후 린데는 세계 최고의 극저온 냉동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하 이하의 온도를 얻을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냉동기술 덕분에 가장 크게 스타일이 변한 와인은 바로 샴페인이다.

샴페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파뉴(Champagne)에서 샴페인 제조법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말하며, 첫번째 칼럼에서 샴페인 글라스의 비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샴페인은 160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1700년대 초창기 샴페인 하우스들에서 상업적인 스파클링 형태의 샴페인을 생산하며, 1800년대 들어서며 파리 왕궁 및 귀족들이 즐기는 와인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였다.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와인을 통틀어서 가장 복잡하고 긴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공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어왔다.
1800년대 중후반 냉동 기술이 개발되기 전의 샴페인들은, 내부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탁한 스타일이었는데, 냉동 기술의 개발로 인해 현재와 같이 깨끗한 스타일의 샴페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샴페인의 제조법에 대하여 이해해야한다.
Figure 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포도를 발효시키면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탄산)가 발생하며, 이를 병안에 모아두면 스파클링(sparkling), 모두 날려버리면 스틸(still) 와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발효에 의한 탄산을 병에 모아두는 일반적인 스파클링과 다르게 샴페인이 최고의 와인이 되는 이유는, 발효를 2번 하면서 특히 2번째 발효는 병 속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제조법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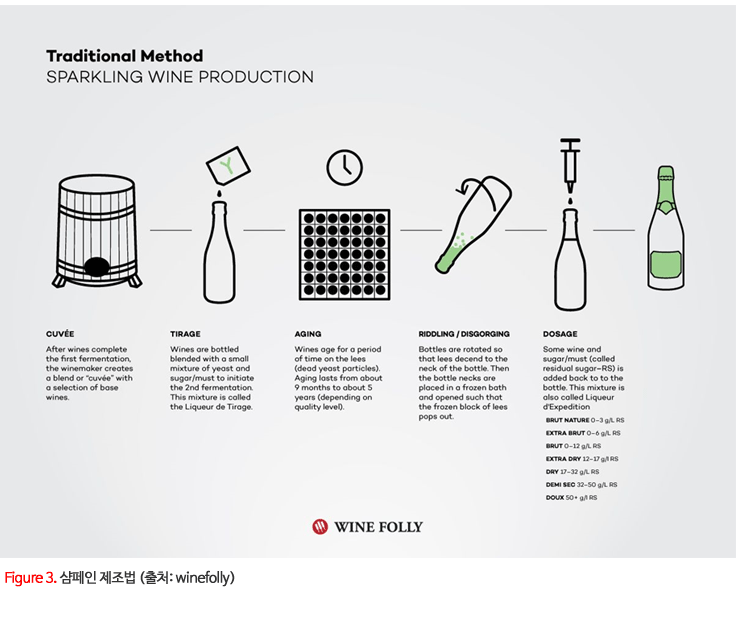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넣고 1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를 베이스 와인(base wine) 또는 리저브 와인(reserve wine)이라고 한다. 이 베이스 와인을 각각의 샴페인 병에 주입하고, 효모와 추가적인 당분을 넣어 (티라주, Tirage) 2차 발효와 숙성을 시작한다.
병 속에서 2차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와인에 녹아들게 된다. 발효를 마친 샴페인 내부의 압력은 약 6기압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약 2.5기압인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압력이다.
2차 발효를 마친 효모 찌꺼기를 리스(lees)라고 부르며, 이 리스와 함께 최소 9개월 이상(고급 샴페인일수록 긴 숙성, 5년 이상 숙성 진행) 숙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컨택트(lees contact) 숙성 덕분에 샴페인에 고소한 빵이나 곡물 류의 풍미가 추가되어 포도의 과일 맛, 향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모습의 샴페인이 만들어진다.
이제 문제는 샴페인 병안에 남아있는 효모 찌꺼기, lees이다. 샴페인 내부에 섞여 있는 이 찌꺼기를 밖으로 꺼내고, 깨끗한 샴페인만 병에 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리스를 빼내기 위해 여기저기 퍼져있는 리스를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를 고안한 사람은 유명 샴페인 하우스인 뵈브끌리코의 끌리코 여사였다.

1772년 탄생한 뵈브끌리코는 병 속의 찌꺼기를 병 목으로 모으기 위하여 샴페인 병을 거꾸로 꽂아두고, 매일 조금씩 병을 돌려 퍼져있는 찌꺼기를 중력의 힘으로 모으는 기법인 르미아주(프랑스어 remiage, 영어로 리들링 riddling)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거치대인 푸피트르(pupitre)를 만들어내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수많은 샴페인 병들을 조금씩 돌리는 수작업을, 적게는 9개월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사람이 직접 하게 되니, 샴페인이 비싸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돌리고 있으나 많은 탑 샴페인 하우스에서는 전통이라며, 여전히 사람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병 목에 모인 찌꺼기들을 깔끔하고, 와인 손실이 적게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끈적한 특징의 리스를 병 밖으로 완전히 꺼내기는 쉽지 않아 여전히 샴페인 내부에는 찌꺼기가 존재하였다.
1800년대에 들어서서 앞서 기술한 냉동기를 이용하여 바로 이 작업을 깔끔하게 해낼 수 있게 된다. 비스듬히 꽂아둔 샴페인 병을 계속 돌리면서 조금씩 병 목으로 찌꺼기를 모은 뒤, 마지막엔 병을 완전히 거꾸로 세워 찌꺼기가 병 입구까지 오도록 한다. 이 후 거꾸로 세워진 샴페인 병 입구를 -27℃의 NaCl 용액에 담궈 리스 부분만 얼려버린다. 이 후 병 마개를 열면, 내부 압력에 의하여 얼린 리스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마치 현재의 샴페인 코르크를 열면 코르크가 뻥 하고 나오는 것처럼) 와인 손실은 없게 되는데, 이로써 현재의 clear 한 샴페인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이 작업을 프랑스어로 데고르주망(degorgement), 영어로 디스고징(disgorging)이라고 한다. 현재의 샴페인을 완성시킨 핵심 기술이 바로 냉동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리스를 얼려 빼낸 뒤, 빠져나간 양만큼 와인을 추가하고 약간의 당분을 추가하는데 이를 도사쥬(dosage)라고 한다. 우리가 음식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실제로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추가 당분의 양에 따라 샴페인 당도가 결정이 되는데, 0-12g/L의 당분 추가일 경우 ‘브뤼 Brut’ 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실제로 마셔보면 단맛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샴페인들이 Brut이다.

위에서 온도 조절을 통한 와인 발효 시간 컨트롤 및 냉동 기술에 의한 샴페인 제조법의 완성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태리 최고 와인 중 하나인 ‘바롤로 Barolo’와 ‘바르바레스코 Barbaresco’의 특징과 스타일의 변화를 와인 발효 온도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태리 북부, 밀라노에서 약 2시간정도 서쪽에 위치한 피에몬테 (Piedmont) 지역은 이태리 최고 와인이라고 불리는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피에몬테라는 뜻은 산의 끝자락이라는 뜻으로 바로 알프스 산맥과 맞닿는 곳으로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며, 알프스의 영향으로 서늘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다.
이 곳에서 자라는 네비올로(Nebbiolo)라는 포도로 바롤로 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에서 만든 와인을 ‘바롤로’라고, 바르바레스코 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에서 만든 와인을 ‘바르바레스코’ 하는데, 라스베리, 체리와 같은 붉은색 과일류의 향과 장미향, 그리고 트러플 버섯과 같은 풍미가 우수하며 탄닌이 매우 강해 풀바디 느낌을 내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파워가 좋은 최고급 와인으로 바롤로를 이태리 와인의 왕, 바르바레스코를 이태리 와인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쪽 지역은 서늘한 기후로 인해 포도가 타 지역보다 늦게 익으며, 따라서 수확시기가 늦은편이며, 수확한 포도를 발효하는 시기 역시 늦은데다가 서늘한 기후로 인해 자연적인 발효 온도가 낮게 된다. 이에 자연스럽게 저온 발효가 진행되는데, 이에 네비올로의 강한 탄닌이 더욱 와인에 추출되어 떫고 강한 스타일의 바롤로/바르바레스코가 만들어져왔다. 그래서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본 모습을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숙성해야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며, 만든지 얼마 안 된 바롤로/바르바레스코는 너무 쓰고 텁텁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즐기지 못하였으며, 이에 바롤로/바르바레스코를 이해하려면 인생의 쓴맛을 맛본 중년은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었다.
이에 점점 와인 시장에서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인기는 줄어들게 되었으며, 프랑스 와인이 전세계를 장악하는 동안 이태리 와인의 왕/여왕이었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명성은 하락세를 그리게 되었다. 이에 젊은 바롤로/바르바레스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바롤로/바르바레스코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를 모던 (modern)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 모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대표 선구자가 안젤로 가야 (Angelo Gaja)로 그의 와인들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피에몬테 지역의 신 부흥기를 가져오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던 바롤로/바르바레스코의 특징은 만든지 얼마되지 않은 (young한) 와인도 충분히 맛있으며 즐기기 좋으면서 네비올로 포도가 가진 과일맛과 탄닌을 잘 살리는 스타일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던 스타일의 바롤로/바르바레스코를 만들기위해서 포도의 재배법, 양조, 숙성에까지 다양한 것들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발효과정에서의 온도 컨트롤이었다.
탄닌이 원래 강한 네비올로 포도를 자연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최신 기계(온도 제어가 가능한)를 도입하여 적정 온도에서 발효를 진행하여 네비올로의 과한 탄닌을 제어하게 된 것이다. 네비올로를 모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이 보다 더욱 중요한 작업들이 더 있지만, 자연 환경의 험난함을 기계 기술로 극복하여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와인은 하나의 발효 식품으로, 1800년대 1900년대를 거치면서 냉동/온도제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양조 공정의 효율화, 표준화를 통해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그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이에 전세계의 사람들이 고품질의 와인을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2020년 현재에는 친환경, 자연 그대로의 것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유행이 되었으며, 이에 와인의 양조과정에서 인위적인것들을 배제하고 과거 자연 그대로의 와인 양조법으로 만드는 내츄럴 와인(Natural Wine)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몇십년간 모던 바롤로의 인기 뒤에 한편으로 가려져 있었던 클래식 바롤로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현재의 와인 트렌드는 다양한 가치와 취향, 스타일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와인 양조 과정에 많은 공헌을 한 기계 기술이 최근에는 오히려 배제 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니,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흥미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계 기술 분야에서는 AI 적용이 큰 이슈인데, 아마도 AI를 활용한 공정으로 만든 와인은 환영 받지 못할 것 같다.